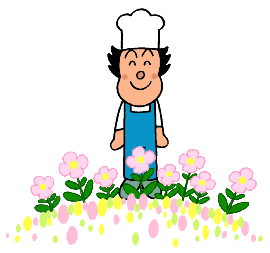전영백의 발상의 전환 - 전영백(2020)
지극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것의 공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 Untitled> 1991.
1996년, 38세에 에이즈로 요절한 작가는 사랑과 죽음을 지극히 체험적 관점에서 다뤘다. 일명 '침대 빌보드'로 통하는 그의 사진작품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연인과의 사적 공간을 신체적 흔적과 함께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누워 있던 자리는 덩그렇게 비어 있고, 구겨진 침대보와 베개는 몸의 무게와 뒤틀던 움직임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동성 애인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두렵게 기다렸을 게다. 애인이 떠나고 난 빈 침대를 사진에 담을 때 애절했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더구나 사회가 용인하지 못하는 관계,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랑이기에 그의 흑백사진은 절실함과 두려움, 삶과 죽음 사이를 동요한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 Untitled(L.A.에서의 로스의 초상)> 1991.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 Untitled(Lover Boys)> 1991.
전자는 작가와 그의 동성 연인이었던 로스 레이콕을 합한 몸무게 355파운드의 사탕을 쌓아둔 것이고, 후자는 로스의 몸무게만큼의 사탕을 쌓아 그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시장 구석에 셀로판지로 싼 사탕을 모아놓고 관람객들이 사탕을 하나둘씩 집어가도록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무게만큼의 사탕 무더기가 서서히 소진되는 과정은 죽음 앞에서 변모하는 육체의 소멸, 병으로 줄어드는 여생을 뜻한다.
달콤한 사탕은 관객의 몸속으로 스며들어가 새로운 에너지가 됨과 동시에, 관객은 작가가 마련한 애도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이 놓아둔 사탕이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가 된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죽음으로 해체되는 삶의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본 것이다.
-
현대미술에선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공적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그 가운데 위험성, 우연성이 개입되고 그 결과는 종종 예측 불가다.
주로 작가가 이를 자초한다. 삶의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예술가가 여기 있다 Artist is Present> 2010, 퍼포먼스.
-
재닌 안토니, <핥기와 비누로 씻기 Lick and Lather> 1993, 초콜릿과 비누.
"초콜릿과 비누로 자소상을 만들어, 내가 스스로 나를 먹이고, 나를 씻기고자 했다."
"핥기와 목욕하기는 둘 다 무척 부드러운 사랑의 행위다."
그는 자신을 천천히 지워가는 작업 과정에 흥미를 느꼈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사랑의 이중적 속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의 개별성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주장하는 게 삶이라면,
이를 뭉뚱그려 남들과 비슷해지는 것은 죽음을 향한 과정이다,
-
현대미술은 관람자의 느낌을 중요시한다.
작가들은 미적 공간이나 환경을 만들어 이를 향유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을 유발시킨다.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 Leviatthan> 2013.
이 엄청난 설치작업은 건축, 엔지니어, 조각의 협업으로 만들어 낸 걸작이다. 충격과 감동의 센세이션을 남긴 이 작업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문 엔지니어 팀인 아에로트로프와 협력하였으며, 공사비로는 3백만 유로(약 38억원)가 투여되었다. 오늘날 미술의 핵심은 '자본'이라는 점을 예시하는 작업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미술의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봐야 한다. 관람자에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적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규모가 커져야 하고, 그럼 건축과 연계되기 때문에 자본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
데미안 허스트